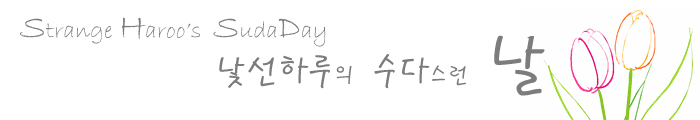이천팔년 구월 이십일
아침 여섯시 이십삼분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 길
순천으로 향한다.
얼마 전 오이도를 다녀온 후 계속되는 바다앓이.
많이 망설였다. 동해로 가느냐, 순천으로 가느냐.
바다앓이와 겹쳐 시작된 계절바뀜병.
지금 이 상태로는 홀로 동해로 가 버리면 그냥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만 같다.
公無渡河 (공무도하)
公竟渡河 (공경도하)
墮河而死 (타하이사)
當奈公何 (당내공하)
저 님아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꼬
(정병욱 역)
핑계다. 내게 있어 동해란 외로움의 상징이다. 너무 외로울 때 도망가는 소도와 같은 곳이다.
그래 아직은 외로움으로부터, 외로움 속으로 도망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게 있어 바다란 참 폐쇄적이다.
오이도, 월미도, 소래포구, 제부도...
바다를 빙자한 유원지들은 웃음을 팔아 하룻밤 수음을 하는 창녀와 같다.
바다에 대한 목마름만 더할 뿐이다.
이번 여행에 순천만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다는 아니다.
도리어 이번 여행에서 기대하는 곳은 송광사.
몇 년 전 바삐 잡은 산행 일정 때문에 새벽에 잠시 스쳐 지나가야만 했는데 이번엔 넉넉히 거닐어 보고 싶다.
바다가 보고 싶어 바다를 피해가는 여행.
길 위에 허투른 마음들을 버리고 오면 좋겠다.
다음 역에서 갈아타야 한다.
가끔은 내 삶도 주어진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 탈 수 있음 싶다.
자! 여행의 시작이다.
아침 아홉시 이십분
고속도로
추석이 지났지만 들은 아직도 푸른 기가 더 깊다.
때이른 추석에 농작물도 농부들도 수고가 많았겠다.
이렇게 나와 봐야 계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을...
대형마트 진열대에 사시사철 놓여있는 과일들에게서 계절을 잊은 지는 오래다.
논산을 지나고 있다.
오랜 만에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한다. 먼 길을 갈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버스다.
버스의 높이에서 바라보는 길과 풍경이 가장 이쁘기 때문이다.
적당히 하늘과 들과 산이 나누어 갖은 시선.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해서 버스의 눈높이가 좋다.
이야기가 담겨있는 눈높이.
사진도 예쁘고 잘 찍은 사진들은 별로 흥미롭지가 않다.
어설프지만 이야기가 담겨있는, 시선이 느껴지는 사진이 좋다.
창 밖에 몇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진다. 버스 안이 술렁인다.
내심 순천만의 일몰을 기대하고 삼각대까지 챙겨왔는데...
나도 오늘은 톡톡 쏘는 듯한 따가운 가을 햇볕에 몸을 맡기고 싶었는데...
창 밖 도로공사장에 누렇게 익어가는 강아지풀 군락이 참 예쁘다.
지금 당장이라도 불도저에 밀려버릴 지도 모르지만, 바들바들 떠는 하룻강아지들마냥 옹기종기 모여서 꼬리를 흔드는 천진난만함.
이름도 예쁜 강아지풀.
낮 한시 삼십오분
낯선 도시에서의 시내버스.
도시 모양이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들의 일상이 내게는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온다.
삶의 시선이 아니라 여행자의 느긋한 시선으로 한 발자국 떨어져 바라보기 때문이리라.
난 아직까지 타인의 삶 속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행자는 되지 못했다. 그저 적당히 떨어져 바라보기만 하는 여행객일 뿐.
버스는 시내를 빠져 나와 시외를 달리고 있다.
낮 두시 오분
굽이굽이 돌아가는 시내버스
시내를 벗어난 뒤로는 타는 이는 없고 내리는 이들뿐.
노곤함과 지루함에 앞자리에 앉은 할매의 고개는 자꾸 뒤로 젖혀진다.
도시의 시간과 시골의 시간은 그 흐름이 다르다.
도시의 시간이 강제적으로 계산된 조각들의 쪼갬이라면, 시골의 시간은 절기에 따라 하늘과 땅에 순응하며 빠름과 느림이 조절되는 흐름이다.
같은 버스를 타고 있음에도 시계(市界)를 벗어나는 순간 시간이 쪼갬에서 흐름으로 바뀜을 느낀다.
결국 시간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내 안의 시계(時計)도 쪼갬에서 흐름으로 바꾼다. 딸깍!
오후 네시 사십분
선암사에서 나오는 버스 안
비록 제철에서 약간 비켜났지만, 그 유명한 선암사 꽃무릇을 보았다.
선암사 꽃무릇도 보고,
몇 년 전 봄에는 선암사 매화도 보고...
이 정도면 참 행복한 녀석이다, 난.
<다음 글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