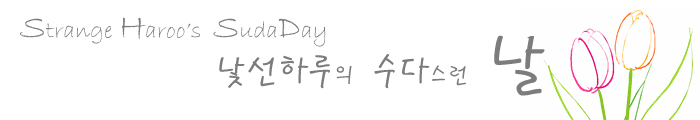"병 때문에 그런지 저는 기억력이 영 형편없어요."
그래서요, 라고 나는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남겨두고 싶어서요. 우리 이야기를."
농부르 선생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지. 나도 정말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 기억이란, 다시 한 번 그 순간을 살아보는 거야. 머릿속에서 말이지."
농부르 선생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마치 자신의 정수리에 무언가 글을 쓰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그 옛 나날들을 두 번 다시 살아볼 수 없다는 거야. 인생 그 자체가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버리는 것처럼."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이치가와 다쿠지 지음, 양윤옥 옮김, 랜덤하우스 중앙
조제 그리고 기억
'징검다리'에 들어 간 이유는 수화를 배우고 싶어서다. 지하철에서다.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여, 나도 수화를 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수화를 배우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해 나가던 첫 봄학기 어느 휴일, 외출 허락이 났다. 일 년 동안은 외출은커녕 외부 소식에 눈과 귀를 막아야 한다는 교칙에 특별 예외다. 선배들 모두 외출을 나가고 신입생들만 게으른 고양이마냥 늘어져 있는 기숙사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행사장으로 향했다. 우리가 할 일은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들의 말 벗이 되어주는 단순한 도우미. 부담감 없이 행사장인 숲 속으로 들어섰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휠체어를 본 적이 없었다. 함께 온 선배들과 동료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짝을 찾았다. 뻘쭘... 다른 표현이 없었다. 내게 먼저 다가오는 이는 없었다. 내 쪽에서 먼저 나가가야 하지만, 난 그냥 뻘쭘하게 주변을 서성거렸다. 행사장 한 쪽 천막에서는 그 동안 먹고 싶어하던 다양한 군것질거리들을 팔고 있었다.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먹거리들을 천천히 구경하였다. 벌써 몇몇 일행은 자신의 짝과 함께 즐겁게 웃으며 그 곳에서 주전부리를 하고 있었다. 숙맥... 아직 짝이 없는 장애인들이 보이긴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질 못했다. 그저 행사장 이곳 저곳을 숙맥처럼 겉돈다. 괜히 물만 마신다. 소변이 마렵다. 화장실로 가는 길은 진흙길이라 길 위에 포대를 덧대 놓았다. 내 앞에 휠체어 하나가 그 포대에 바퀴가 엉겨서 앞으로 잘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엉겁결에 도와준다.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니가 나온다. 서로 쑥스러운 표정. 서로 말없이 행사장으로 돌아왔다. 그니의 친구 한 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니와 친구 그리고 난 그렇게 그 날 하루를 함께 보냈다.
그리고 축제 때 그니를 다시 보았을까? 왔었을 텐데 기억에 없다. 그 시절 기억은 지우개로 지운 듯이 정말 깨끗하게 지워졌다. 아니 억지로 지워버렸다, 마치 내 인생에 그런 시절은 없었다는 듯이. 단지 몇몇 기억이 침묻힌 연필로 쓴 것처럼 지우개 질에도 지워지질 않았을 뿐...
축제 때의 기억이라고는 농아학생들을 안내하다 바이올린인지 플루트이었던지 연주를 보며 클래식 선율이 아름답지 않냐고 물어보고 얼굴 빨개졌던 기억. 옛 사랑과 헤어지며 울음을 터트리던 여학생. 축제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던 빨래방 사람들. 모두 돌아간 후 축제의 마지막을 즐기는 동료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도서관 지붕 첨탑에 불던 바람...
다시 그니의 기억은 바닷가 가까운 커다란 시설.
학교와 기숙사가 함께 들어서 있는 그 시설은 내가 있던 곳보다도 더 세상과 멀리 있는 듯 했다. 방학이라 집에 가지 못한 몇몇만이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하루.
나의 방문은 그네들에게 지루함을 달래줄 오락거리였고, 오랜 만에 만나는 외부 사람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니가 한 번도 극장엘 가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바닷가 길은 더 황량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그니가 고향인 제주도에서 돌아오던 날이다.
처음으로 가본 공항에서 난 기다렸고, 환하게 웃으며 그니는 나왔다.
우린 택시를 타고 그 바닷가로 향했다. 택시운전기사는 우릴 다정한 연인으로 보았고, 농을 던졌다.
아마 우린 몇몇 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확한 기억의 파편은 재 가공되었을 것이다.
그 후 난 똘레를 당하고, 나름 힘겹게 세상과 친해지지 못하고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고....
아마 그니도 나도 서로 부정은 했지만, 그게 사랑이었을 게다. 그니와 내가 서로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었더라면... 아마 조금은 더 예쁜 모습의 사랑이었을 수도 있었을 게다. 조금은 더 아름다운 첫사랑.
실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제대 후 한 참을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오래된 편지...
동기 한 명이 내 대신에 맡아주었던 편지를 뒤늦게 알게 된 내 주소로 보내 주었다.
날짜를 보니 군에 있던 때다.
그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그니의 직장은 나와 가까운 곳이다.
그러나 그 시절 내 삶은 그리 녹녹하지 않았다. 세상과의 부딪힘에 힘겨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려 하였다. 결국 그니의 마지막 편지도 다른 과거의 흔적들과 함께 불길 속에 타버렸다.
가끔 그니 생각을 한다. 잘 살고 있겠지. 꼭 극장엘 데려간다는 약속 지키고 싶었는데...
가끔 그니의 회사 앞으로 가는 버스를 만난다. 그 버스를 타면 그니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난 그니의 얼굴도, 그니의 이름도 모두 잊어버렸다.
아마 어디선가 그니를 닮은 예쁜 아기를 낳고, 그 아기의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쁘게 살고 있겠지... 그녀의 예쁜 미소처럼 말이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한 편의 영화가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기억의 작은 끄트머리를 잡아당긴다.
그리고 그 파편들을 두서없이 꺼내 맞추어 본다.
내 기억력은 형편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