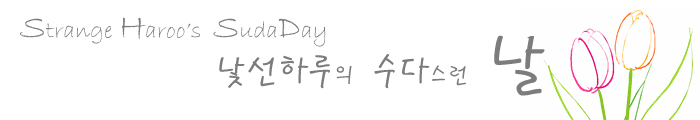2008년 8월 6일
오전 10시 16분 시내버스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가듯 아빠 산소를 간다.
하루 4번 밖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
사오제 때 한 번 대중교통으로 다녀온 후 처음.
승용차를 이용하면 세시간이면 다녀올 거리를 일부러 버스를 타고 팔월 더위에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죄스러움 때문이다.
미안하기 때문이다.
안스러움 때문이다.
오늘은 길을 걷자.
신은 그대와 함께 있겠지?
아빠 ---.
오전 11시 시외버스
거창하게 산티아고 가는 길과의 비유로 시작했지만, 실은 대부분의 길을 버스로 이동하는 아주아주 짧은 길이다.
단지 마음만 Via Crucis다.
일부러 선택한 더운 날의 한 낮...
mea culpa, mea culpa, mea maxima culpa.
비록 이젠 그가 내 안의 신은 아니지만... 아빠를 그에게로 인도한 것은 나였다.
그리고 아빠를 실망 시킨 것도 나였다.
지금 아빠를 찾아 가는 것도 나다.

오후 12시 17분 다시 시내버스
역시 쉬운 길은 없다.
8월 1일부로 터미널의 위치가 바뀌었다.
내가 알아온 모든 정보는 쓰레기통에나 넣어야한다.
날은 덥고 새로 지은 건물의 시멘트 냄새는 코를 자극한다.
낯선 곳에서의 방향감 상실. 그것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온다. 순간적일지라도...
우선 점심을 먹고 다시 길을 찾자.
오후 12시 30분 설렁탕집
날이 더운데 뜨거운 국물이 마시고 싶다.
실은 약간 돌아가는 것일 뿐.
단지 과거 기억과의 어긋남이 인터넷 정보와의 어긋남보다 더 충격이었나보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십오년 전의 그 시골 모습을 기대하다니?
밥이 나왔다.
오후 1시 20분 버스정류장
시골일수록 길을 물음에 신중해야거늘, 몇 번의 잘못된 기다림 끝에 이제야 원하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하루 4번 있는 버스는 벌써 떠났고, 그 근처로 가는 버스도 30여분을 기다려야 한다.
버스 정류장에는 대부분이 노인들이시고 사이사이 교복입은 여학생들이 복숭아마냥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목적지를 찾아 갈 수 있다는 방향성이 맘을 진정시킨다.
이제사 좀 여유를 갖고 어두운 구멍가게에 들어가 냉장고를 더듬어서 차거운 물을 한 통 사왔다.
어르신들도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죄송스러 물병으로 얼굴만 조금 문지르고 가방 속에 집어 넣었다.
어르신들도 바뀐 시간표에 아직 적은이 되질 않으셔서 시간이 되도 오질 않는 버스에 짜증을 내신다.
기억은 그런거다. 현실은 바뀌었음에도 저 기둥에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 놓았음에도, 바뀜을 앓에도
기억은 그런거다.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기억이다. 자꾸만 쌓인 기억은 추억이 되고, 주름이 되고,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기억(혹은 추억이라 불리는)에 변화를 가하면 아픈 것이다.
오후 1시 40분 버스 안
버스가 들어왔다. 20분 버스가 왜 이제야 오느냐고 투덜대는 어르신들과 버스 시간표가 바뀌었다고 변명하는 기사의 느릿느릿 여유로운 실갱이와 함께 버스에 오른다.
버스 안은 도시의 시내버스보다 더욱 차거운 바람으로 에어컨디셔너가 부릉거린다.
시장 앞.
아직 어린 동남아에서 시집온 새댁들이 김치거리를 사가지고 버스에 오른다.
이 어린 신부들이 서투르게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진다.
이런, 버스가 내가 지금껏 헤매던 길을 거슬러 가다 시내를 빠져나온다.
시내를 벗어나니 금방 낮익다.
십오년이나 지났는데도......
오후 2시 40분 정자나무아래
아빠산소로 가는 길은 산티아고로 가는 길처럼 정적인 길은 아니다.
아스콘 공장, 레미콘 공장, 골프장 건설 등으로 계속해서 커다란 볼보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길이다.
그리고 주변 축사에서 풍기는 분뇨냄새는 잠깐 차를 타고 지나면서도 차창을 열지 못하게 만들정도로 독하다.
이런 길을 십오년 전에 엄마와 동생은 하얀 소복을 입고 삼복더위에 걸어가셨다.
마음도 몸도 모두 무거웠던 그 길을 휘적휘적 하얀 소복 치마는 땀에 절어 더욱 무겁게...

오후 3시 아빠
살아계실때, 아빠랑 난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우린 거의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으면 우린 싸웠다.
서로 너무 닮았음을 알았기에 서로가 서로의 그 약점들이 너무도 싫었다.
가까와지기위해 노력을 안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친해지기에는 너무도 닯았던 우리.
돌아가신 뒤에도 난 아빠의 이미지와 싸우고 있다. 아직도.
다시 십오년 뒤면 사진 속의 아빠와 비슷한 또래가 되는 구나.
여름 잡초 무성한 공원묘지에서 그래도 아빠 산소는 정갈해서 좋다.
삼복 한 여름에 돌아가시니 이런 복도 있으시네...
이젠 갈께 잘 있어 아빠...
오후 3시 41분 10-다-12
幸州奇公그레고리오亨度之墓
1960.2.25 - 1989.3.7
젊어 요절한 시인의 무덤 앞에 와있다.
한 번 찾아봐야지 하며 이제야 처음 들른 발걸음.
60년생인 시인은 지금 살아있다면 그의 무덤처럼 머리가 듬성듬성 벗겨질 나이가 되었구나.
사실 너무 어두워 그의 詩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요절할 것을 미리 알았을까, 젊은 시인은? 아무리 시대가 어두었다곤하지만, 그의 시는 어두움이 아닌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다.
비록 그의 시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는 내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체, 빈센트, 밥, 마더, 빠빠와 함께...

오후 4시 51분 시원한 에어컨디셔너가 있는 버스 안
죽기 일보 직전에 버스를 탔다. 무엇을 믿고 이 더위에 물도 안가지고 걷기 시작했을까?
실은 처음엔 물이 있었다. 그러나 술 한 병도 안 가지고 시인의 무덤을 찾은 게 미안해 가져갔던 물을 술대신 시인의 무덤에 뿌렸다.
그러고 보니 아빠에게 미안하다.
다시 수돗가에가서 물을 받아서 아빠에게 갔다.
아빠 미안해... 담에 맛있는 술 사올께...
아빠나 나나 술은 잘 못한다. 하지만 나도 아빠만큼이나 담배를 피웠었다.
담배를 끊고 나니 꽃마져도 안 사온게 미안했다.
물을 듬뿍듬뿍 뿌렸다. 무덤 위에도 묘석 위에도 상 위에도
아빠 진짜 간다. 또 올께...
그리곤 그냥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오르막도 아니고 내리막인데 뭐 그리 힘들까? 쉽게 생각했다.
문제는 길이 아니라 날씨였다. 한낮이 지났음에도 땅은 식을 줄을 모른다.
길옆 콩잎은 축축 늘어져 있고, 고추는 태양처럼 붉게 익는다.
올라갈때는 그리 목이 마르지 않았는데, 내려오는 길엔 유독 목이 마르다.
그러나 구석진 구멍가게 하나 없다.
예전에 버스정류장 옆 집이 구멍가게 였던 생각이 난다.
버스정류장까지만 가면 물을 마실 수가 있어...
이런... 예전 가게였던 곳은 마루로 바뀌어 있다. 보통 가정집이다. 주인도 안계시다.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 버스를 기다린다.
이런 어리석음이여... 버스 시간을 적어 오질 않았다.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시간에 한 대나 혹은 두 대씩 있었던 것 같은데...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버스 정류장은 지저분했다. 그러나 그늘은 거기뿐...
대충 구석에 놓인 신문지로 닦아내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린다.
심해지는 갈증. 머리도 어지럽다.
신을 벗어 발을 식혀주며 버스를 기다린다.
(너무 더워 쓰고 싶은 글의 단어만 나열했던 수첩의 기억을 더듬어 쓰니 글이 길어진다.
길 위의 길은 짧다. 길이 길기 때문에...
그만 쓰자 길의 글이 아니다.)
오후 6시 37분 집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여행은 끝났다.
짧은 여행.
길은 길지만 여행은 짧다.
길을 모두 가지 못하는 까닭이다.
아까 아빠 무덤에서부터 시인의 무덤까지 따라왔던 검은 색의 잠자리...
자꾸 아빠란 생각이 든다.
아빠 맞지?
고마와...
2008년 8월 6일 아빠에게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