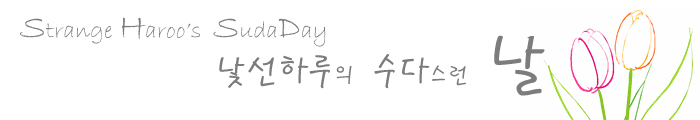산엘 다녀왔습니다.
산아래에는 할머니들이 갓따온 토마토를 팔고 계셨습니다.
마트에서처럼 보기좋게 빨갛지도 않고 윤기나게 매끄럽지도 않고 크기도 올망졸망한 녀석들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색바랜 주황색 플라스틱 바구니에 하나 가득 넘치도록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 앉으신 할머니는 고구마줄기를 까느라고 쳐다도 안 보시더군요.
"할머니, 토마토 어떻게 해요?"
"팔천원... 고구마줄기도 사 가지? 이천원에 줄께..."
결국 고구마줄기까지 한 짐을 사서 차에 올랐습니다.
토마토는 따뜻했습니다.
따뜻하고 아직 파란색이 도는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물컹거리며 온기가 베어 있는 과즙이 입 안 가득 흥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과실에 익숙한 입 안 가득 퍼지는 햇살이 남아있는 과실의 맛은 어릴 적 기억 저편으로 데려 갑니다.
아직 햇볕 잘드는 마당이 있는 집에 살던 시절.
가장자리를 장식한 색색의 채송화, 손톱을 물들이던 봉선화, 달콤한 꿀이 나오던 깨꽃, 봉긋한 꽃술이 입술연지를 닮아 루즈베리라 불렀던 루드베키아, 굵은 씨알때문에 가을이면 씨 따는 재미가 있던 붓꽃, 벌을 잡아 앵앵거리는 소릴 듣다 쏘이던 호박꽃 들과 몽실한 살구알들이 주렁주렁 열리던 살구나무, 항상 딱 한 개의 열매만을 맺던 딱딱하고 시기만한 돌배나무, 가녀린 줄기에 겨우 몇 송이의 포도만을 달고 있던 포도나무, 제사때만 딸 수 있던 대추나무, 가을이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던 은행나무 등이 듬성 심겨있던 작지만 풍성한 마당에는 상추와 토마토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냉장고는 여름 김치를 넣어두는 곳이었기에 소쿠리에 담아 부엌에 놓아 두던 토마토는 언제나 따뜻한 햇볕의 과실이었습니다.
한 움큼 베어물면 토마토 속의 햇살까지 한 움큼.
변소에 앉아 볼일을 보다가도 빨갛게 잘 익은 놈이 보이면 재빨리 나와서 슥삭 옷에 문지르곤 한 움큼.
참 오랜만에 어린 시절 마당도 추억하며 맛난 토마토도 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일부러 녀석들을 시원한 냉장고에 넣질 않고 눈에 잘 보이게 식탁 위에 올려 놓고는
먹음직스런 놈부터 한 움큼.
추억도 한 움큼.
아마도 다시 토마토를 사러 산엘 가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