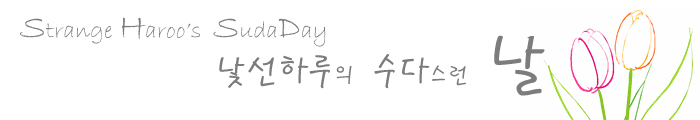올 봄에는 매화를 보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서 일까...
바람난 처녀애같은 연분홍빛의 벚꽃보다 좀더 진득해 보이는 매화에 더 끌리게 된다.
한창 봄이 무르익을 무렵 살랑 살랑 꼬리치는 벚꽃보단
아직 매서운 바람이 섬진강을 워이 돌아갈 무렵 등줄기 훔츠리며 바라보는 매화가 더 고고해 보인다.
내가 매화를 안지는 얼마 되질 않았다.
허나 매화를 안 이후 매년, 봄이 왔음을 확인하기 위해 매화를 찾았다.
올 봄에도 매화를 피었다 지고,
난 매화를 보지 못했다.
창살무늬 환자복을 입고, 10층 높이의 고만고만한 하늘로 푸르러지는 병원 화단을 바라보며
매화를 그리워 했을 뿐이다.
특히 작년에 보았던 설중매를 그리워 하고 있었다. 그 찬바람이 그리웠던 게다.
가슴 속에 바람이 불어오면 좋으련만.... 내 가슴도 10층 높이의 창문이 꼭꼭 닫혀 있었다.
10층 아래 화단에는 목련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벚꽃도 피었다.
그러나 매화는 피지 않았다.
단지 주말 신문의 한 쪽에 커다랗게 매화가 피었다 구겨지고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졌을 뿐이다.
그렇게 봄 왔다.

봄이 한참을 와서 여름이 가까워지는 요즘까지 난 매화를 꿈꾸었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푸르른 청매실을 한아름 사가지고 오셨다.
커다란 등나무 바구니에 우르르 쏟아 놓으니 그 푸르름에 눈이 부시다.
매실을 처음보는 두돌박이 조카녀석이 옆으로 다가와 매실을 한 웅큼 쥐더니 덥썩 입에 문다.
녀석의 입 안에 침이 한 가득 고이고, 내 얼굴엔 웃음이 한 가득 머문다.
매실을 담근지 며칠이 지났다.
내게 달려온 조카녀석 입 주위에 누런 가루가 덕지덕지 묻어 있다.
입에선 시큼한 내음이 난다.
어머니께서 매실을 담가 놓은 항아리로 갔다.
역시나 조카녀석이 그 신내나는 달착지근한 내음의 유혹을 못 이기고
한 웅큼 매실과 함께 담가 놓은 설탕을 슬쩍한 것이었다.
코 끝으로 전해지는 시큼한 단내는 입안 가득 침이 고이게 만든다.
나도 조카녀석같이 설탕에 절여 놓은 청매실을 안 움큼 쥐고
아무 꾸밈 없이 입에 고인 침을 흘리며 그 신내나는 열매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단내에, 그 시큼함에 녹슬어 버린 내 가슴도 열려 버릴 것 같다.
매화를 그리워 하며 시작된 봄이
이렇게 청매실의 시큼함과 함께 가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 일까...
바람난 처녀애같은 연분홍빛의 벚꽃보다 좀더 진득해 보이는 매화에 더 끌리게 된다.
한창 봄이 무르익을 무렵 살랑 살랑 꼬리치는 벚꽃보단
아직 매서운 바람이 섬진강을 워이 돌아갈 무렵 등줄기 훔츠리며 바라보는 매화가 더 고고해 보인다.
내가 매화를 안지는 얼마 되질 않았다.
허나 매화를 안 이후 매년, 봄이 왔음을 확인하기 위해 매화를 찾았다.
올 봄에도 매화를 피었다 지고,
난 매화를 보지 못했다.
창살무늬 환자복을 입고, 10층 높이의 고만고만한 하늘로 푸르러지는 병원 화단을 바라보며
매화를 그리워 했을 뿐이다.
특히 작년에 보았던 설중매를 그리워 하고 있었다. 그 찬바람이 그리웠던 게다.
가슴 속에 바람이 불어오면 좋으련만.... 내 가슴도 10층 높이의 창문이 꼭꼭 닫혀 있었다.
10층 아래 화단에는 목련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벚꽃도 피었다.
그러나 매화는 피지 않았다.
단지 주말 신문의 한 쪽에 커다랗게 매화가 피었다 구겨지고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졌을 뿐이다.
그렇게 봄 왔다.

봄이 한참을 와서 여름이 가까워지는 요즘까지 난 매화를 꿈꾸었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푸르른 청매실을 한아름 사가지고 오셨다.
커다란 등나무 바구니에 우르르 쏟아 놓으니 그 푸르름에 눈이 부시다.
매실을 처음보는 두돌박이 조카녀석이 옆으로 다가와 매실을 한 웅큼 쥐더니 덥썩 입에 문다.
녀석의 입 안에 침이 한 가득 고이고, 내 얼굴엔 웃음이 한 가득 머문다.
매실을 담근지 며칠이 지났다.
내게 달려온 조카녀석 입 주위에 누런 가루가 덕지덕지 묻어 있다.
입에선 시큼한 내음이 난다.
어머니께서 매실을 담가 놓은 항아리로 갔다.
역시나 조카녀석이 그 신내나는 달착지근한 내음의 유혹을 못 이기고
한 웅큼 매실과 함께 담가 놓은 설탕을 슬쩍한 것이었다.
코 끝으로 전해지는 시큼한 단내는 입안 가득 침이 고이게 만든다.
나도 조카녀석같이 설탕에 절여 놓은 청매실을 안 움큼 쥐고
아무 꾸밈 없이 입에 고인 침을 흘리며 그 신내나는 열매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단내에, 그 시큼함에 녹슬어 버린 내 가슴도 열려 버릴 것 같다.
매화를 그리워 하며 시작된 봄이
이렇게 청매실의 시큼함과 함께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