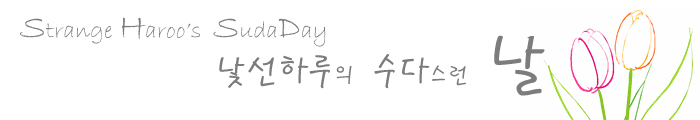2007년 6월 18일
9시 24분 남부고속버스터미널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을 떠나는 행위이다.
가장 멀리 떠나고 싶었다. 가능한 가장 멀리……
그래 봤자 현실 안에서의 도피겠지만……
남해행 표를 끊었다.
월요일 출근길의 지하철을 비집고 빠져 나온 버스터미널은 묘한 떠남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
에너지 중에 가장 파장이 큰 것은 설렘이다. 설렘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터미널 안.
삼삼오오 모여 여행을 떠나는 젊음들 사이로 삶의 연장으로 길을 떠나는 어두운 얼굴의 중년들……
월요일 아침 배낭을 메고 터미널에 앉아 있는 나는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질까?
경직되어 있는 얼굴 근육이 느껴질 정도로 굳어 있는 내 표정.
이제 차가 들어오고, 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11시 57분 금강 인삼랜드 휴게소
정신 없이 잤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 도망치듯 떠나온 여행. 그러고 보니 평일에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얼마만이지?
아직 여행은 내게 익숙한 행위는 아니다. 더욱이 평일의 여행이라니......
전혀 붐비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금 내 여행이 그리 평범하지 않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만 같다.
너무 심한 작위(作爲)일까?
14시 50분 남해버스터미널
다랭이마을(가천)행 표를 끊었다.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 붕 떠버린 시간. 삶이 기다림이건만 아직도 기다림엔 익숙하지 못하다.
점심시간이 한참을 지났건만 식욕이 없다. 마음이 무거워서 일까?
그래도 여행을 하려면 속을 먼저 채워야 한다. 우선 점심을 먹자.
서울 --> 남해 22,000
남해 --> 가천(다랭이마을) 2,000
점심 4,000
물 500
담배 2,500
15시 27분 버스(다랭이마을행)
40분발 버스 안이다. 툴툴거리는 시골 마을버스를 상상했는데 낡은 우등버스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버스 안은 찜통이다. 후후, 방금 기사아저씨가 에어컨을 켜준다.
평일 낮이라 그런가? 버스터미널은 파장한 장터와 같이 한적하다.
3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 시간도 녹아 느릿느릿 흐르는 느낌.
내가 아직 여행을 모르지만 이 시간의 느림이 자꾸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여행이란 시간으로의 떠남이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빠르게 흐르는 삶의 시간을 잠시나마 느리게 흐르게 하는 행위.
비록 버스는 내가 바라던 시골버스가 아니지만, 그 분위기만은 시골버스 그대로이다.
도시에서 느껴지던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의 초초함이 없다.
시골 아낙 셋과 나. 이렇게 넷이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느긋하게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여행은 일부러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냥 주어진 길 위에서 길의 흐름대로 떠나보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시간보다 멈추어 기다리는 때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내가 살아온 삶도 그와 비슷하다. 흐름에 맞추어 흘러가던 시간보다 뒤쳐지고 좌절함이 더 많았던 시간.
다시는 흐름에 뒤쳐지지 말자 다짐을 했건만 또 다시 흐름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다.
(버스가 남해읍내로 들어서자 갑자기 부산해진다. 서로서로 자리를 챙겨주고, 서로 너무도 잘아는 일상의 안부를 묻는다. 정답다.
참 상투적인 표현임에도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버스 안을 가득 채운 정다움. 괜스레 내게도 전염되는 기분이다. 그래 지금 난 위안을 받고 싶은 것이다. 버스는 달린다. 여기는 남해다.)
--> 왜 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썼다 지웠다. 너무도 상투적이고 센티한 기분이 싫어서였을까?
5시 15분
다시 바다와 마주하고 앉아 있다.
바닷가 바위에 앉아 파도를 바라본다.
수평선을 바라본다.
어릴 때는 그토록 멀리만 느껴졌던 수평선이 참 가깝다.
수평선에는 섬이 하나 있다.
그리고 섬에는 하얀 무인등대가 하나 있다.
섬 옆에는 커다란 외항선들이 바다를 드나든다.
섬은 길이 되어 있다.
난 길 잃은 여행자가 되어 섬을 바라보고 있다.
21시 31분
막차가 끊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
3시간 반을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다. 커다란 만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착지점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푸른 바라를 바라보며 즐겁게 걸었다. 그러나 해가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게 되자 서서히 힘도 빠진다. 해가 지기 전에는 두 시간 반을 쉬지 않고 걸었건만, 어둑어둑 해지자 벌써 두 번째 쉬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구나……
지금 내 삶에도 목적지가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길 위에 서 있건만 내 눈엔 길이 보이질 않는다.
가끔은 누군가가 내 길을 제시해 주었음 좋겠다. 그것이 신이라도 좋겠다.
그러나 아무도 길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신이라도 말이다.
오직 나만이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아직 목적지까지 11키로가 남았다. 그만 일어나서 걷자.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삶의 목적지도 찾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할 수 없음은 내 자신이 너무도 잘 안다.
삶과 여행이 다른 점은 돌아갈 곳이 있고 없음이다.
덧글;
이 후로 2박 3일간 계속 걷기만 했다. 그러나 발견한 것은 도로 위에서 죽은 두더지 시체뿐이었다. 두더지는 왜 인도도 없는 사 차선의 아스팔트로 꽉 막힌 도로까지 기어 나와 로드킬을 당했을까…?
그 때 내 맘 속의 두더지도 함께 묻어 주었다.

9시 24분 남부고속버스터미널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을 떠나는 행위이다.
가장 멀리 떠나고 싶었다. 가능한 가장 멀리……
그래 봤자 현실 안에서의 도피겠지만……
남해행 표를 끊었다.
월요일 출근길의 지하철을 비집고 빠져 나온 버스터미널은 묘한 떠남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
에너지 중에 가장 파장이 큰 것은 설렘이다. 설렘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터미널 안.
삼삼오오 모여 여행을 떠나는 젊음들 사이로 삶의 연장으로 길을 떠나는 어두운 얼굴의 중년들……
월요일 아침 배낭을 메고 터미널에 앉아 있는 나는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질까?
경직되어 있는 얼굴 근육이 느껴질 정도로 굳어 있는 내 표정.
이제 차가 들어오고, 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11시 57분 금강 인삼랜드 휴게소
정신 없이 잤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 도망치듯 떠나온 여행. 그러고 보니 평일에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얼마만이지?
아직 여행은 내게 익숙한 행위는 아니다. 더욱이 평일의 여행이라니......
전혀 붐비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금 내 여행이 그리 평범하지 않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만 같다.
너무 심한 작위(作爲)일까?
14시 50분 남해버스터미널
다랭이마을(가천)행 표를 끊었다.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 붕 떠버린 시간. 삶이 기다림이건만 아직도 기다림엔 익숙하지 못하다.
점심시간이 한참을 지났건만 식욕이 없다. 마음이 무거워서 일까?
그래도 여행을 하려면 속을 먼저 채워야 한다. 우선 점심을 먹자.
서울 --> 남해 22,000
남해 --> 가천(다랭이마을) 2,000
점심 4,000
물 500
담배 2,500
15시 27분 버스(다랭이마을행)
40분발 버스 안이다. 툴툴거리는 시골 마을버스를 상상했는데 낡은 우등버스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버스 안은 찜통이다. 후후, 방금 기사아저씨가 에어컨을 켜준다.
평일 낮이라 그런가? 버스터미널은 파장한 장터와 같이 한적하다.
3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 시간도 녹아 느릿느릿 흐르는 느낌.
내가 아직 여행을 모르지만 이 시간의 느림이 자꾸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여행이란 시간으로의 떠남이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빠르게 흐르는 삶의 시간을 잠시나마 느리게 흐르게 하는 행위.
비록 버스는 내가 바라던 시골버스가 아니지만, 그 분위기만은 시골버스 그대로이다.
도시에서 느껴지던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의 초초함이 없다.
시골 아낙 셋과 나. 이렇게 넷이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느긋하게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여행은 일부러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냥 주어진 길 위에서 길의 흐름대로 떠나보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시간보다 멈추어 기다리는 때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내가 살아온 삶도 그와 비슷하다. 흐름에 맞추어 흘러가던 시간보다 뒤쳐지고 좌절함이 더 많았던 시간.
다시는 흐름에 뒤쳐지지 말자 다짐을 했건만 또 다시 흐름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다.
(버스가 남해읍내로 들어서자 갑자기 부산해진다. 서로서로 자리를 챙겨주고, 서로 너무도 잘아는 일상의 안부를 묻는다. 정답다.
참 상투적인 표현임에도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버스 안을 가득 채운 정다움. 괜스레 내게도 전염되는 기분이다. 그래 지금 난 위안을 받고 싶은 것이다. 버스는 달린다. 여기는 남해다.)
--> 왜 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썼다 지웠다. 너무도 상투적이고 센티한 기분이 싫어서였을까?
5시 15분
다시 바다와 마주하고 앉아 있다.
바닷가 바위에 앉아 파도를 바라본다.
수평선을 바라본다.
어릴 때는 그토록 멀리만 느껴졌던 수평선이 참 가깝다.
수평선에는 섬이 하나 있다.
그리고 섬에는 하얀 무인등대가 하나 있다.
섬 옆에는 커다란 외항선들이 바다를 드나든다.
섬은 길이 되어 있다.
난 길 잃은 여행자가 되어 섬을 바라보고 있다.
21시 31분
막차가 끊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
3시간 반을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다. 커다란 만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착지점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푸른 바라를 바라보며 즐겁게 걸었다. 그러나 해가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게 되자 서서히 힘도 빠진다. 해가 지기 전에는 두 시간 반을 쉬지 않고 걸었건만, 어둑어둑 해지자 벌써 두 번째 쉬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구나……
지금 내 삶에도 목적지가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길 위에 서 있건만 내 눈엔 길이 보이질 않는다.
가끔은 누군가가 내 길을 제시해 주었음 좋겠다. 그것이 신이라도 좋겠다.
그러나 아무도 길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신이라도 말이다.
오직 나만이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아직 목적지까지 11키로가 남았다. 그만 일어나서 걷자.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삶의 목적지도 찾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할 수 없음은 내 자신이 너무도 잘 안다.
삶과 여행이 다른 점은 돌아갈 곳이 있고 없음이다.
덧글;
이 후로 2박 3일간 계속 걷기만 했다. 그러나 발견한 것은 도로 위에서 죽은 두더지 시체뿐이었다. 두더지는 왜 인도도 없는 사 차선의 아스팔트로 꽉 막힌 도로까지 기어 나와 로드킬을 당했을까…?
그 때 내 맘 속의 두더지도 함께 묻어 주었다.